당대의 번역가이자 신화 저술가
고 이윤기의 산문 추려 모아
‘원문 뒤 숨은 푹 익은 우리말’ 등
번역과 문장에 대한 생각 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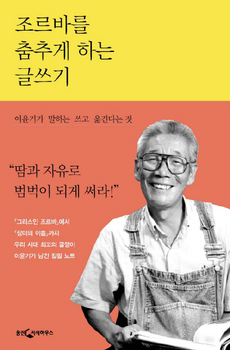 |
조르바를 춤추게 하는 글쓰기
이윤기 지음
웅진지식하우스·1만3800원
소설가로 시작했으나 곧 당대의 번역가가 되었고 이윽고 신화 저술가로 이름을 날린 사람. 고 이윤기(1947~2010·사진)의 이력은 이렇게 줄일 수 있을 테지만, 그것으로 족할까.
그의 벗이자 문학평론가인 황현산은 이렇게 쓴다. “이윤기가 있었다”고.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경상도 산골 마을의 언어가 있었다. 이 언어 천재는 그리스나 라틴의 고전어뿐만 아니라 첩보요원들이나 감옥의 죄수들이 쓰는 말까지도 제 고향 말과 만나 낯익은 울림을 얻을 때에만 그 언어를 진정한 언어로 여겼다”고.
이윤기는 ‘우리 시대 최고의 소설가’란 상찬은 받지 못했을망정 ‘우리 시대의 문장가’라는 수식어가 버겁지 않은 글쟁이였다. 세 해 전에 급작스럽게 타계한 이윤기의 글에 대한 생각, 번역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글들이 한 권 책으로 묶여 나왔다. <조르바를 춤추게 하는 글쓰기>는 생전에 발표된 산문 가운데서 ‘쓰고 옮기는 일’에 관한 글을 추렸다. 그가 걸어온 삶의 갈피가 스며 있어 재미도 나거니와, 읽다 보면 심히 드러나는 그의 문자 중독, 독서 편력에 새삼 ‘징그러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첫 글은,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이윤기는 답한다. “쓰지 않고는 못 배길 것 같아서, 라고 또 쓰고 싶지는 않다”고. 못 배겨서 쓴 글은 이상하게도 아무 울림도 지어내지 못했다면서도 “그런 글을 쓰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는 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면, 문학을 하는 이유는? 그는 이렇게 에두른다. “문학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그렇게 풀렸다.”
취학 전엔 한글 딱지본 소설을, 초등학생 때는 만화책을, 중학생 때는 학원사 학생문고를 읽으며 “아, 글이라는 게 세상을 이렇게 넓게 살도록 하는구나. 글 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었다”고 쓴다. 열다섯 살 늦깎이로 중학생이 되어 2학년 때 도서관 사서 노릇을 하면서는 “미당 서정주의 시집을 읽는데, 읽는 족족 암기하게 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고 쓰고도 그 다음 문장에선 “자랑이 아니다”고 넉살을 부린다. 남들 고등학교 다닐 때 독학해야 했던 그는 “혼자서 영어를 배워 헤밍웨이, 포크너를 읽었고, 일본어를 공부해 미시마 유키오, 나쓰메 소세키를 읽었”다.
그는 ‘어찌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느냐’고 물으면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쓰면 초단은 되어요” 하고 답한다. 한데 이렇게 쉬운 걸 왜 여느 사람은 못할까? “유식해 보이고 싶어서 폼 나는 어휘를 고르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제 생각을 비튼다. 제 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생각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번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화학적 변화’를 주창한다. 물리적 변화만 일으키는 “그런 번역은 컴퓨터도 해낸”다. 번역은 “사전과의 싸움”이요, “살아 있는 표현을 찾는 일”이요, “원문의 배후에 숨어 있는, 푹 익은 우리말을 찾아내는 일”이다. 가령 ‘나싱 투 루즈’를 ‘더는 잃을 게 없다’고 옮기면? “나무랄 번역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색을 그만둬선 안 된다. 더는 잃을 것 없는 상황을 우리말로는 ‘밑져야 본전’이라고 하지 않는가. 반드시 그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거기까지 모색한 뒤에 그 말결에 걸맞은 말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문화의 힘 가운데 상당 부분은 번역에서 나온다고 믿는다. 소설 쓰는 행위조차도 “문자 문화를 향한 현상의 번역 행위”로 여긴다. 그런데 그에게 번역가의 명성을 안겨준 <장미의 이름>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비참하게 한 소설”이기도 했다. 잘못 번역한 대목들을 누군가의 지적을 받아 고쳐서 개정판을 냈던 일화를 들려주면서 “오독하고 오역한 것이 매우 부끄러웠다”고 고백한다.
책 제목 ‘조르바를 춤추게 하는 글쓰기’란 무엇일까. 그 자신이 ‘조르바에게 난폭한 입말을 돌려주기’란 글에서 사뭇 열기에 들뜬 어조로 쓰고 있기도 하지만, 그가 옮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의 한 대목이 그 물음에 답한다. “사람을 당신만큼 사랑해본 적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 쌓이고 쌓였지만 내 혀로는 안 돼요. 춤으로 보여드리지. 자, 갑시다.”
‘읽고 쓰는 인간’인 ‘나’ 앞에서 ‘살아 버리는 인간’ 조르바의 춤은, 이윤기가 전하는 카잔차키스의 말을 옮기자면, “메토이소노”(거룩하게 되기)이다.
그는 1977년 단편소설 <하얀 헬리콥터>로 등단한 뒤 번역의 길에 들어서 <장미의 이름>, <푸코의 진자>, <그리스인 조르바>를 비롯해 200여권의 책을 옮겼고, 2000년대 들어선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가 일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한국 독서계에 신화 붐을 일으켰다.
‘바닥을 기어본다는 것’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1991년 내 나이 마흔다섯 되던 해. 문득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 싶었다. … 번역도 내게는 중요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었다.”
그해에 그는 외국행을 택했다. 그곳에서 바닥부터 박박 기었고, 그 덕에 소설가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술회한다. 그러곤 소설 <숨은그림찾기1-직선과 곡선>으로 1998년 동인문학상을, <두물머리>로 2000년 대산문학상을 받았다. 그것으로 성에 찼을까? 그는 문단의 주류는 아니었다. 생업으로 시작한 번역은, 물론 생업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긴 했을 터이지만, 그에게 ‘이 시대의 소설가’라는 수식어는 꼭 가닿고 싶은 밤하늘 별과 같은 것이었으리라.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